통영에 오면 통영을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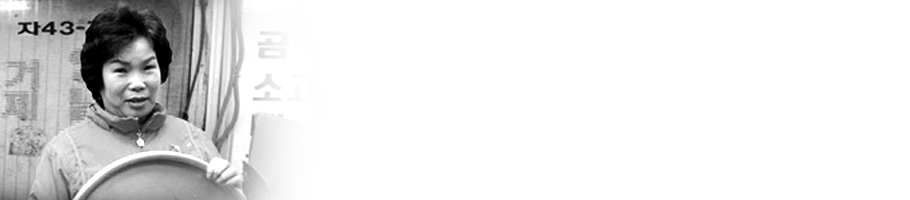
"다 잘 돼야지, 나 혼자 잘 될라고는 안했어"
통닭골목 30년 지킴이, 박순두
아버지 냄새가 먼저 풍기는 그곳
1970년대 말 식용유가 보급되면서 튀김통닭이 인기였다. 80년대에는 페리카나를 필두로 양념치킨이, 90년대는 간장소스를 무기로 한 교촌치킨이 주름 잡았다. 2000년대는 청양고추를 양념으로 두른 불닭이 불같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여기에 안동찜닭이나 닭갈비까지 끼워 넣으면 인기 닭요리의 역사는 그야말로 변화무상하다.
통영 중앙시장에는 '통닭골목'이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도 꽤 사연이 많은 곳인데, 아쉽게도 '여전히 그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남아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많은 가게들이 통닭보다는 생닭 장사로 돌아섰지만 간판들은 아직 '통닭'이고 메뉴판에도 그게 제일 크게 적혀 있다.
오랜만에 가게에 들러 주문을 하니 30년 된 튀김 솥에서 30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튀긴 닭이 상위에 놓인다. 그런데 어릴 때 먹던 것과 맛이 다르다.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짧은 내 세치 혀가 변했다고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배달시켜 먹는 프라이드치킨에는 없는 추억이 여전히 아삭아삭 씹힌다. 거나하게 취해 갈지(之)자 걸음으로 노란 돌까리 종이에 기름 잔뜩 묻은 것을 꼭 끌어안고 오셔서는 "자, 사이좋게 노나무라" 하고 턱 던져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고향친구들에게 통닭골목을 같이 가자하고는 '통닭' 하면 뭐가 떠오르냐 물었더니, 녀석들의 옛 추억이 별반 다르지 않다. 고등학교 때 선생들 몰래 술 먹으러 다니던 걸 먼저 떠올리는 이도 적지 않지만 '초등학교 운동회 끝나고' '졸업식 날에' '몇 살 생일날에' '상 받은 날에' 등등 요새말로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사주시던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
근데 왜 대부분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였을까?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 밥 놔두고 닭을 사먹는 것이 엄마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게다. 그나마 아버지는 술안주로도 삼았거니와 푼돈이라도 손에 쥐어지는 날에는 자식에게도 그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냉큼 통닭 골목을 찾았을런지도 모른다.
-

▲ 가마솥 사진
-

▲ 통닭 튀기는 모습
-

▲ 가게 앞 모습
살림 불어나는 재미에 고생도 몰랐던 그 시절
통영에선 흔히들 뽀빠이 통닭집이 맛있고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는 중앙시장 통닭골목 풍경이 그리웠다. 가서 가장 오래된 통닭집이 어딘지 물으니 누구는 '거제통닭집'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충무통닭집'이라고도 한다. 아무려나 내가 맡고 싶은 내음은 같을 듯해 마침 가게 문이 열려있던 충무통닭집으로 들어섰다.
충무통닭집은 박순두(54)와 숙련(42) 자매가 운영한다. 언니 박순두씨는 79년에 장사를 시작했고, 동생이 같이 한 것도 10년이 넘는다. 이제는 대학생인 박순두씨의 아들도 거든다. 하지만 가게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다. "손님이 없네요"물었더니 "누가 가게 훔쳐갈까비 지키고 앉았다"고 농을 치지만 뼈에 닿는 말이다.
박순두씨는 24살 때 첫애를 놓고 두 달 만에 가게를 열었다. 마침 친언니가 김해에서 알을 낳을 만큼 다 낳은 늙은 닭을 가져와서 닭 튀기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가르쳐주었다고 하니 세자매가 모두 닭과 인연을 쌓은 것이다.
빤한 이야기지만 통닭에 빠뜨릴 수 없는 두 가지는 닭과 기름이다. 닭을 빨리 키워내 는 기술, 즉 닭고기 대량생산이 가능한 '육계'는 60년대 중반에서야 가능해졌고, 해 표식용유가 나온 것은 70년대 중반을 넘어서의 일이다. 그러니 79년, 재빠르게 통영에 통닭집을 열었다는 건 언니의 덕을 좀 본 셈이다.
박순두씨는 통영에선 처음으로 생닭 유통도 했다. 김해에서 가져온 걸 시내에는 물론 한산도, 욕지도, 사량도 등 섬으로 보냈다. 당시에는 도계장이 없어서 그 많은 닭을 박순두씨가 일일이 손봐야 했는데, 위생문제로 시장에선 닭을 못 잡게 해서 미수동 골짜기나 용남면 동달리 등 사람이 살지 않는데 가서 잡아와야 했다. 겨울이면 손에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위에 고생을 했고, 오토바이로 나르다보니 산과 시장을 수없이 오갔지만 고생인줄 모르고 열심히 했다. 가게가 잘 되어 거래처가 늘고 살림이 부는 걸 보는 기쁨이 더 컸던 탓이다.
"세 들어 살던 가게도 내 것이 되고 하니깐 재미가 붙어서 더 할라고 했지. 인자는 아들 삼형제 다 공부시켰것다, 경기도 엉망이고 해서 아등바등 살려고도 안해."
페리카나에도 우리 집 닭을 주고 그랬지
메뉴판을 보니 튀김통닭 값이 8천 원이다. 우리 아부지가 얼마나 큰 작심을 하시고 통닭을 사줬던 걸까 싶어 당시 가격을 물었더니 처음엔 800원 했다가 3,4년 뒤에는 1천500원도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통닭이 800원 할 때 한 끼 밥값이 1천500원이었다니, 과연 서민들의 영양식이라고 할 만하다. 폐계를 쓰고 기름 한 번 부으면 스무 마리는 튀겨냈으니 그런 값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것마저도 큰맘 먹어야 살 수 있을 만큼 서민들의 살림이 어렵던 때이기도 했다.
또 하나 어릴 적에 궁금했던 건 왜 아버지가 사오는 통닭에는 닭똥집이 두 개인데 내가 사면 하나 밖에 안 들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똥집 두 개 달린 닭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박순두씨의 대답으로 오랜 궁금증이 싱겁게 풀렸다. 추가로 더 사놨다가 손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 더 넣어주곤 하는 '유도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음식점을 찾았으니 맛의 비결을 안 물을 수 없다. 골목이 온통 통닭집이니 다른 집보다 손님을 많이 끌려면 신경이 이만저만 쓰인 게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외의 답이 건너온다.
"손님들이 와서 누구 집이 우떻터라캐사도 내는 내 방식대로 했지. 다 잘돼야 좋지, 누구 집보다 더 잘 돼야지 이런 거는 없었어. 튀김이야 다 비슷비슷하고 차이가 난다면 양념에는 제깐 비법이 다 있지. 간절이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해야 하니까. 페리카나도 단체주문이 밀리면 우리 집 생닭을 갖다 쓰기도 했으니깐. 장사를 오래 안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만 오래 겪은 나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지."
오래 하면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이다. 통닭집 골목은 졸업식이나 운동회 때면 간만에 기름진 닭 맛 좀 보겠다는 사람들로 줄이 늘어서곤 했다. 나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골목에서 줄을 선 기억이있다. "잘 될 땐 줄도 엄청 길었지요?" 했더니 5,6명 넘어가면 딴 집으로 넘어가기 일쑤란다.
근데 난 왜 그 줄이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을까. 얼른 먹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라도 났던 게 분명하다. 어쨌거나 이젠 그런 풍경도 옛 사진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통닭골목에서 궁리해보는 관광지 개발전화 한통이면 방까지 배달해주는 프랜차이즈 치킨의 공세도 공세지만 해운센터,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이 강구안에서 서호동으로 넘어간 뒤로는 표가나게 통닭 찾는 사람이 줄었다. 닭이라는 게 아무래도 복날에 가장 많이 먹으니 여름 한철 장사인데, 그나마 여름이면 이래저래 더 사람들을 꼬이게 해주던 여객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니 복날 재미도 한풀 꺾였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강구안을 비워 수변 공원을 만든다느니 요트를 띄운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관광지로 만든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유동인구가 경제인구를 당해낼 수 없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상인들에게 오기 마련이다.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에서 회를 사고 장을 본다한들, 강구안에 배를 대는 사람들만 할까?
중앙시장이 활기를 잃으면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러 올까? 내가 통닭골목을 찾았을 때도 그나마 자리에 앉은 이들은 동네 어르신들이거나, 피부색이 깜쪼름한 이방인을 낀 뱃사람들이었다.
어쨌거나 지금도 통닭거리엔 통닭을 찾으러 오는 이가 몇 없다. 충무통닭집의 경우 매출만 놓고 보면 생닭 유통이 90%나 차지한다. 통닭골목에 사람이 없으니 상인마저 무료할 판이다.
오죽하면 첫마디에 가게 훔쳐 갈까봐 앉아 있는 것이라고 했을까. 박순두씨는 그래도 가게를 지킬 생각이다.
"외지에 가서 살아도 대가족이 전부 우리집을 안 이자삐고 찾아오기도 한다. 그랄 때는 어찌나 반가운지, 또 기다리고 있어야지 싶다. 그런 단골이 여럿이다. 가게나 거래처도 정이 들만큼 들었고, 나이도 있는데 (업종이나 위치를) 바꿔서 뭐하겠노. 우리 아들 서이 다 키워서 공부시킨 것도 여기 이 집이다. 이제는 반가운 사람 만나는 재미로라도 살어야지."
박순두씨의 푸념이 혼잣말로만 들리지가 않는다. 강구안이 통영의 항구 중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그 자리는 시민들이, 서민들이 차지했으면 좋겠다. 없는 걸 달라는 것도 아니다.
요기만이라도 그저 냅두라는 것이다.
- 담당자
- 관광지원과 관광안내소 (☎ 055-650-0580,2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