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에 오면 통영을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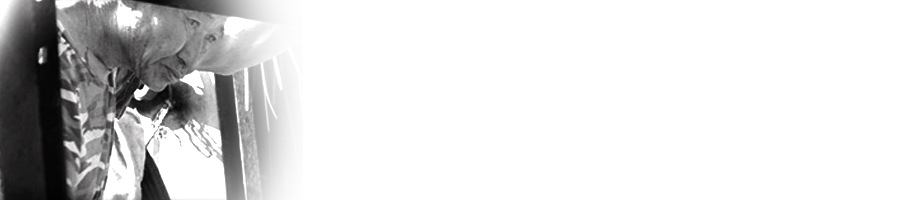
"이젠 저승에서나 두들겨야지"
충무공작소 이평갑 어르신
기구 박물관 충무공작소
이평갑 어르신(6)은 중앙시장 충무공작소에서 35년을 지냈다. 내가 묻자 "40년을 했나, 50년을 했나?"하고는 말 나온 김에 헤아려보자고 셈을 하신다. "충무공작소는 40년 됐고, 내가 여기 온 지는 35년 됐구먼. 1살에 처음 시작한 일이니 여기 오기 전부터 새터 오씨상회서 했던 것까지 따지면 50년이 꽉 차네."
하지만 50년으로 대장장이를 졸업하는 게 아니다. 몸이 따라주는 데까지는 불구덕과 망치를 놓을 생각이 없다. "인자 죽고 나면 저승 가서 해야지 머"한다. 그 목청이 아직 정정하다. 뵈러갔을 때가 1월이었는데도 반팔 면티셔츠 한 장만 걸치고도 "항개도 안 춥다, 사시사철 맨날 이러고 산다"고 한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면 충무공작소 앞에선 쇠 두드리는 소리가 쾌청하고 시뻘겋게 어른거리는 불 향기 사이로 장정들이 웃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충무공작소에 대한 내 기억에도 겨울은 없다.
"그때는 4명이서 야근까지 했어. 갈수록 일이 없어지니깐 하나 둘 떠나고 이젠 나만 남엇지. 5년 전에 전 주인에게 이걸 내가 맡기로 할 때도 그랬고 요새도 그렇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걸 운동 삼아 용돈 벌이로나 하지 무슨 돈이 나오것나."
충무공작소 진열대를 바라보면 '없는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낫, 호미, 괭이 등 농기구는 물론이요, 해녀들이 멍게 해삼 딸 때 뜨는 갈쿠리, 목수들이 쓰는 다이구 우에사시 도치 짜구, 중앙시장 다라이 아지매들이 쓰는 회칼도 상당수는 그의 작품이다. 닻과 배못, 볼트도 대장간 불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웬만한 것은 철물점에서 다 판다. 요즘은 중국산까지 가세한 데다 트럭까지 돌아다니니 세월을 탓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충무공작소 바로 앞에도 철물을 파는 트럭이 끊임 없이 오간다. 하지만 어르신 눈엔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다.
"해방다리 쪽에만 해도 대장간이 일고여덟 곳은 있었지. 요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 없어지는 걸 우짜것노. 얼마 전에는 완도와 백령도에서도 주문서를 들고 여기까지 찾아온 손님도 있더라고. 요기까정 없어지면 배 같은 데 쓰는 주요 부품을 행여 고쳐 쓰지 못해 큰일이라도 날까 그게 걱정이야."
하긴 나도 사라져가는 풍경이라 기록으로 남겨보자고 나선 일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장간 안을 기웃거리는 카메라들이 제법 많다. 이미 방송국에서도 10번이나 찍어갔다고 한다.
"아침저녁 밥 때 되면 하는 방송들 있잖아. '6시 내고향' '세상의 아침' 이런 데서 물건 이름을 갈차주라고 하는데 죄다 일본말로 씨부리니깐, 방송이라서 안 된다고 우리말로 갈차 달라고 하데. 내 좀 식겁을 했지. 뭐 출연료라고 몇 푼 쥐어주면 그걸로 친구들하고 술 받아 묵고 그랬지."
-

▲ 작업중인 모습
-

▲ 이평갑 어르신의 손(바닥)
-

▲ 이평갑 어르신의 손(등)
점쟁이 "쇳소리를 따라가라"고 하다
어르신이 대장장이가 된 데에는 웃지 못 할 사연이 하나 들었다. 농사를 짓고 살다 1살 되기 전 동지섣달에 새해 토정비결을 본답시고 점집엘 갔더니 점쟁이가 쇳소리 나고 손재주를 써먹는 일이 들어오면 두말 말고 따라가라고 했다. 이평갑은 그 자리에서 피식 웃었다. 다른 친구들은 팽이고 연이고 얼레고 다들 제 손으로 만들어 놀았지만 그는 그런 재주 하나 없는 자기 손을 무던히 원망만 하고 살던 터였다. 그러다 고모와 형제지간인 오씨상회 할매가 불러 갔다가 '점쟁이가 바로 대장간 일을 말한 거였구나, 참 용하다'고 무릎을 쳤다. 그리곤 점쟁이가 일러준 것처럼 두 말도 않고 생전 처음으로 취직을 한 데가 거기다.
다섯 살,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 아래 있다가 고모집으로 와선 월사금이 없어 학교에선 집으로, 집에선 학교로 쫓겨 다니다가 10살 때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했다.
"쥐약 먹고 뱉기도 했을"정도로 서럽고 눈물도 많았던 아픈 나날이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릴만큼 많았다. 이평갑은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면서 자신도 달궜던 것이다.
"일 시작하고 한 보름 정도는 몸도 쑤시고 어깨도 아프고 아주 힘이 들었지. 그거 지나고 나니깐 괜찮더라고. 뭐 굴까는 일도 그렇고 몸 쓰는 건 다 그때까지가 제일 그렇지."
그래도 50년 동안 대장간을 떠나고 싶을 만큼 대장간 일이 징할 때가 더 없었냐고 했더니 그런 적은 없단다. 하지만 다음날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먼저 입을 뗐다.
천직인줄로만 알고 살았지만 내가 그렇게 묻고 간 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다.
이 시린 이야기도 앞에서 말한 점쟁이와 얽혀 또한 재미있다.
선풍기도 없던 시절. 그러니깐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에는 대장간 구덕 불을 피우려면 그때마다 불매를 불어야만 했다. 지금이야 전기와 황으로 불을 피우지만 그때는 그 불매질에 손등어리가 무르고 터지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이발소에 가서 가만 보니 이발사 손이 하도 하얗고 고운 게 부러웠는지 딴 생각이 들었다.
"점쟁이 말대로라면 이것도 쇳소리 나고 손재주 써먹는 건데 싶더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따리를 싸들고 나오다가 마침 아는 사람을 만났다.
"이발사는 손님이 와야지만 돈을 벌지만 니는 맨들어 놓고 파는 거니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성급히 들었던 보따리를 스르르 손에서 놓고 말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평갑은 그 뒤 영원한 대장장이가 되었다.
남들이 잘 한다니깐 힘든 줄도 몰랐지
"인자 쇠로 하는 거는 다 만들지만, 평생 안 해본 거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맞춰주려고 하지. 그게 또 배우는 거고. 고생 끝에 성공 온다는 말이 하나두 틀리지 않아"
1남2녀 자식들 공부 다 마치고 출가도 시켰고, 아내도 내조를 잘 하고 있으니 이만한 삶 또한 없다. 그래도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평갑에겐 30년 전이 가장 잘나가던 시절이었다.
"바로 요 가게 길에 고쳐 달라, 용접해 달라, 갈아 달라는 물건이 몇 층으로 쌓일 정도로 일이 많아서 성냥깐 식구들이 밥을 따로 묵었어. 내가 점심을 묵고 오도록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지. 나한테 맡길라구 말야. 서로 먼저 해달라고도 하고, 남의 것은 슬쩍 발로 툭툭 차서 순서를 뒤로 밀기도 했었고. 그게 실력이 있다는 소리니깐 일이 많은 것은 생각두 않고 마냥 좋았어. 그라곤 그냥 가지도 않아. 술 담배라도 받아 주면서 고맙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땅에선 씨 뿌리고 열매 거두는 계절, 바다에선 도다리 나고 전어 나는 계절인 봄가을이면 주문이 밀린 호미 낫 괭이 닻 회칼들이 더더욱 수북이 쌓였던 자리. 이제는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이 앉아 충무공작소는 겨우 드나들 수 있을만큼 문이 좁아졌다.
"일 하는 거 보려면 아침에나 와, 점심 묵고는 일도 없어" 하는 어르신의 어깨도 덩달아 좁아 보인다.
이야기를 마치려는 찰나, 마침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칼을 사더니 좀 갈아달라고 한다.
그러곤 어르신이 칼을 갈자마자 아무래도 바빠서 안 되겠다고, 나중에 집에서 써보고 잘 들지 않으면 그 때 갈러 오겠다고 한다.
어르신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면서도 묵묵히 칼을 간다. 윤오영의 수필 '방망이를 깎던 노인'이라는 산문이 절로 떠오르는 장면이다. 이 손님도 집에 가서야 어르신의 솜씨와 정성에 감탄할는지 모를 일이다.
쇳덩이 뜨겁게 활활 달구던 대장간엔 노을이 지고 있다. 아침이고 낮이고 서슴없이 드나드는 오랜 벗들이 그 온기를 함께 쬐고 있다.
어르신의 쇳소리는 통영사람 모두에게 오래도록 울릴 것이다.
-

▲ 공작소 간판
-

▲ 공구 모습
-

▲ 작업 모습
- 담당자
- 관광지원과 관광안내소 (☎ 055-650-0580,2570)













